|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규칙적인 운동
- 녹차
- AI반도체 #메모리슈퍼사이클 #HBM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픈AI #스타게이트 #반도체주 #소부장 #코스피
- #AI방산 #군집드론 #미래전쟁 #무인전투기 #방위산업 #탈레스 #보잉 #노스럽그러먼 #자율무기 #전자전 #사이버보안 #통합전투지휘체계 #MUM-T #IBCS #드론전술 #국방기술 #방산기술 #AI무기 #무인화전쟁 #로봇병사 #군사혁신 #차세대전술 #국방AI #스마트국방 #군집로봇
- 쌀값비교 #한국일본쌀값 #레이와쌀소동 #쌀값폭등 #농업정책 지역/국가 #한국농업 #일본농업 #동아시아농업 #한일비교 경제/시장 #쌀시장 #농산물가격 #식량안보 #농업경제 #유통구조
- 고사성어
- 온천치료
- 부동산투자
- #APEC #경주 #외국인소비 #관광특수 #지역경제 #APEC정상회의 #경주관광 #K뷰티 #국제행사 #관광산업 #경제효과 #문화관광 #외국인관광객 #카드결제 #소비증가 #호텔업 #뷰티산업 #경주경제 #국제회의 #관광활성화
- 대화의기술 #비폭력대화 #소통법 #인간관계 #건강한관계 #경청 #존중 #갈등해결 #커뮤니케이션 #리상룽
- #뉴로모픽반도체 #AI반도체 #한국반도체 #차세대기술 #석민구교수 #컬럼비아대 #ISSCC #GPU #인공지능칩 #반도체산업 #기술혁신 #10년투자 #반도체연구 #한국기술력 #미래기술
- 행복
- #AI혁명 #인구절벽 #초고령사회 #기후위기 #글로벌인재포럼2025 #평생학습 #인재육성 #노년부양비 #디지털전환 #저출생대책 #OECD #한국사회 #미래전략 #교육혁신 #공공서비스혁신 #생산가능인구 #의대쏠림 #사교육문제 #AI인재 #지속가능발전
- 소비쿠폰
- 한국AI예산2026 #초혁신경제72조원 #AI3강전략 #피지컬AI투자 #국민성장펀드
- 건강
- #장애인통계 #장애인고령화 #초고령화사회 #대사증후군 #사회적고립 #장애인건강 #정신건강 #우울증 #신체활동부족 #장애인복지 #건강불평등 #사회적관계망 #주거빈곤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정책 #건강권 #사회참여 #이중취약성 #복지사각지대
- 한미관세협상 #트럼프 #대미투자 #무역협상 #조선업 #농산물개방 #경제외교 #통상정책
- #무림PP #펄프몰드 #친환경포장 #플라스틱감축 #진공포장 #지속가능포장 #ESG #탈플라스틱 #자원순환 #친환경기술 #그린포장 #재활용 #환경보호 #식품포장 #생분해성포장 #순환경제 #제로웨이스트 #친환경혁신 #스킨포장 #포장기술
- 온천
- 링크비 #페이스웹 #글로벌비즈니스 #AI번역 #의료관광 #MICE산업 #K컬처 #클라우드솔루션 #SaaS #다국어지원 #해외진출 #비즈니스플랫폼 #스타트업 #디지털전환 #한류 #국제회의 #전시산업 #문화콘텐츠 #올인원솔루션 #글로벌마케팅
- 코오롱티슈진 #TGC #인보사 #골관절염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FDA승인 #바이오신약 #DMOAD #한국바이오 #재생의학 #관절염치료 #바이오투자 #신약개발 #글로벌제약 #K바이오
- 인생칼럼
- 온천요법
- 통신사AI #소버린AI #AI인프라 #5G네트워크 #데이터센터 #GPUaaS #SK텔레콤 #엔비디아 #AI주권 #통신기술혁신 #스마트시티 #IoT연결성 #AI민족주의 #차세대통신 #디지털전환
- AMD주가 #오픈AI #AI반도체 #뉴욕증시 #나스닥 #반도체주 #기술주투자 #금리인하 #데이터센터 #엔비디아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미국주식 #주식투자 #AI붐 #테슬라 #연방정부셧다운 #금융시장 #투자전략 #증시분석 #기술주전망
- 혈관건강
- #정년연장 #고령화사회 #초고령사회 #일본정년제도 #독일노동정책 #대만정년폐지 #노사관계 #세대갈등 #청년일자리 #재고용제도 #임금피크제 #노동정책 #사회적합의 #계속고용 #정년폐지 #인구고령화 #노동시장 #고용정책 #연금제도 #소득공백 #중장년고용 #생산가능인구 #노동개혁 #임금체계개편 #주4.5일제 #노동유연성 #경제정책 #복지정책 #사회보장제도 #고령인력활용
- 혈관
- 워런트 #주식 #투자 #테크산업 #클라우드컴퓨팅 #브로드컴 #오라클 #AI추론 #빅테크 #오픈AI #AMD #AI반도체 #엔비디아 #챗GPT #MI450 #GPU #리사수 #샘올트먼 #AI컴퓨팅 #데이터센터 #반도체산업 #기술주 #테크뉴스 #인공지능
- Today
- Total
필라이프 Phil LIfe
숙손통(叔孫通) : 생존을 위해 주군을 바꾼 현실주의 유학자 본문

중국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대 중 하나인 진한 교체기를 살아간 인물 중에서, 숙손통(叔孫通)만큼 논란이 많은 인물도 드물다. 그는 유학자였지만 전형적인 유학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고, 원칙보다는 현실을 택한 극한의 실용주의자였다. 오늘날까지도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혼란스러운 시대를 헤쳐나간 한 지식인의 생존 전략과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진시황 시대: 아첨으로 살아남은 박사
숙손통은 진시황 때부터 문학에 뛰어나다는 평을 받아 조정에 불려가 박사 후보자가 되었다. 그의 진정한 면모가 드러난 것은 진시황 사후 이세황제 호해 시대였다.
진승이 산동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호해는 박사들과 유생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30여 명의 박사와 유생들은 일제히 "진승은 반란군이니 당장 토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숙손통은 황제의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호해가 자신의 정치 실패를 지적받는 것에 불쾌해한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숙손통은 앞으로 나아가 공손하게 말했다. "저들의 말은 다 틀렸습니다. 진승은 일개 좀도둑일 뿐이니 지방의 관리들이 알아서 처벌할 것입니다. 자애로우신 황제 폐하의 은총으로 모든 백성이 법을 지키고 있는데 무슨 반란이란 말입니까?"

당연히 살아남기 위해 극단적인 아첨을 보인 것이다. 호해의 얼굴은 즉시 밝아졌고, 숙손통에게 옷과 비단을 하사하며 박사 벼슬에 임명했다. 다른 유생들이 "어찌 그리 아첨을 잘 하느냐"고 묻자, 숙손통은 "내가 그렇게 아첨하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 호랑이 입에서 못 나왔을 것"이라며 빨리 도망칠 준비나 하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호해는 반역자라고 대답한 사람들을 어사에게 넘겨 처형해버렸다.
변장하고 도망친 후 줄타기 인생
숙손통은 변장을 하고 고향인 설(薛)로 돌아갔다. 그곳을 점령한 항량에게 몸을 맡겼고, 이후 회왕을 섬겼다가 회왕이 의제로 추대되어 강남으로 이주하자 그냥 남아 항우를 섬겼다. 그러다가 항우의 세력이 약화되자 유방에게 항복했다. 그야말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군을 바꾸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행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유방에게 항복한 후의 변화였다. 원래 유학자들이 입는 길고 치렁치렁한 도포를 입고 다니던 그가, 누군가로부터 '한왕 유방은 유자의 옷을 질색한다더라'는 말을 듣고는 즉시 도포를 벗어버리고 제자들까지 일부러 초나라 풍습의 짧은 옷을 입게 했다.
그 모습에 흐뭇해진 유방이 '어디에 쓸만한 사람이 없느냐'고 묻자, 숙손통은 학문이 뛰어난 자들은 놔두고 왕년에 떼도둑이었거나 깡패였거나 주먹만 잘 쓴다는 자들만을 추천했다. 제자들이 불평하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지금은 한왕 유방이 화살과 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하를 다투고 있는데, 그대들이 나가서 싸울 수는 있는가? 그래서 일단 적장을 베고 깃발을 빼앗을 이를 천거하였다. 그대들은 조급해 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보라. 내가 잊지 않고 있다."
漢王方蒙矢石爭天下,諸生寧能鬬乎?故先言斬將搴旗之士。諸生且待我,我不忘矣。
나무위키 일부 인용
본인도 유학자면서 '유학자는 전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제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현실이 얼마나 냉혹했는지, 그리고 숙손통이 얼마나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는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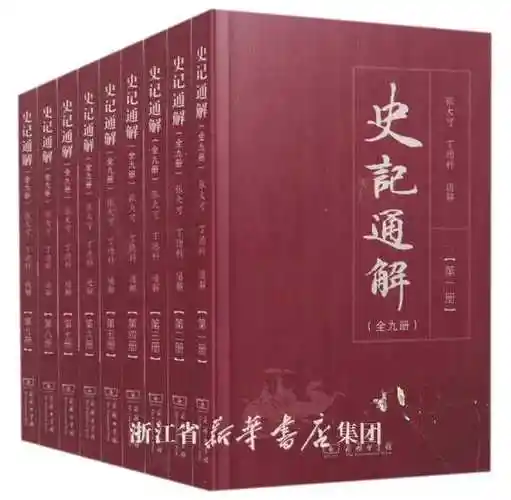
한나라 예법 제정: 현실주의의 결정판
초한대전이 끝난 후 직사군으로 봉해진 숙손통에게 진정한 활약의 기회가 왔다. 당시 한나라의 궁중예절은 그야말로 엉망이었다. 한고제 유방부터 한미한 출신에 추종자들의 상당수도 예의범절과 거리가 멀었고, 진나라의 복잡한 예식을 잘라내버리니 궁중에서는 공적 다툼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몸싸움을 벌이고 심지어 칼을 뽑아 대궐의 기둥을 찍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 골머리를 앓던 유방에게 숙손통이 제안했다.
"선비들은 전쟁터에 나아가 빼앗는 것은 어려워하지만, 지키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원컨대 노나라의 여러 선비들과 함께 조정의 의례를 만들어보고 싶사옵니다."
夫儒者難與進取,可與守成。臣願徵魯諸生,與臣弟子共起朝儀。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의 예법 철학이었다. "오제는 각기 다른 음악을 즐겼고 삼왕의 예는 서로 달랐습니다. 예란 시대와 사람들의 정서에 따라 간략하게 하기도 하고 화려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고대의 예법과 진나라의 의례를 취해 한나라의 의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 '시대가 지나면 예법이 변하지 않나? 그거 예법이 구색 맞추기라서 그렇다. 지금 필요한 대로 적당히 짜맞추면 된다'는 뜻이었다. 철저히 실용주의적인 접근이었다.
이에 유방이 허락하자 숙손통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법을 만들려 했지만, 이 중 2명이 "예악은 100년간 기다려야 만들 수 있는데 못하겠다"며 거부했다. 숙손통은 "시대의 변화를 모르는군"라고 답했다.
기원전 200년 장락궁이 완공되자 새로 만든 예법을 시험해보았다. 날이 밝자 알자가 예식을 주관하여 차례대로 대전에 들어오도록 했고, 뜰에는 전차, 기병, 보졸, 위관이 병장기와 깃발을 세웠다. 황제가 연을 타고 나오면 백관이 기를 들어 경고하고, 제후왕부터 600석의 관리까지 차례대로 황제에게 하례했다. 의례가 끝나면 연회를 벌였는데, 술잔이 9번 돌 때까지 아무도 떠들거나 예를 잃지 않았다.
이 예법에 따라 조회가 진행되자 유방은 비로소 "내가 이제야 황제의 존귀함을 알겠구나"며 기뻐했다. 숙손통은 그 공로로 태상에 제수되고 황금 500근을 받았으며, 함께 작업한 제자들에게도 낭관 벼슬을 내리게 했다.
원칙이 필요한 순간의 강직함
현실주의를 추구한 것은 형식에 가까운 예법에서뿐이었다. 원리원칙이 중요한 곳에서는 유학자답게 칼 같았다. 유방이 말년에 여후의 아들인 혜제 대신 척희의 아들 유여의를 황태자로 삼으려 하자, 숙손통은 여희의 고사와 진시황의 고사를 예로 들어 강력히 반대했다.
"소신의 피를 궁궐 바닥에 흩뿌린 후에 태자를 바꾸십시오."
이는 적장자 승계의 원칙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의미였다. 평소 주군도 수시로 바꾸던 그가 정말 중요한 원칙 앞에서는 목숨을 걸 정도로 강직했던 것이다.
엇갈리는 평가: 기회주의자인가, 현실주의자인가
숙손통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당시부터 유가들에게 무수한 비난을 받았다. 예법을 만들 때도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훨씬 후대에 자치통감을 저술한 사마광도 '숙손통 같은 사이비가 이런 짓을 하는 바람에 예법에 큰 상처를 입혔다'며 분개했다.
반면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감탄했다. "숙손통은 시대의 요구에 맞춰 급한 일부터 순서대로 처리하고 예법을 정비했다. 그의 물러가고 나아감은 모두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따랐으며 마침내 한나라의 큰 유학자가 되었다. 참으로 곧은 길은 굽어보이며, 길은 원래 구불구불한 것이라는 이야기는 숙손통의 경우에 딱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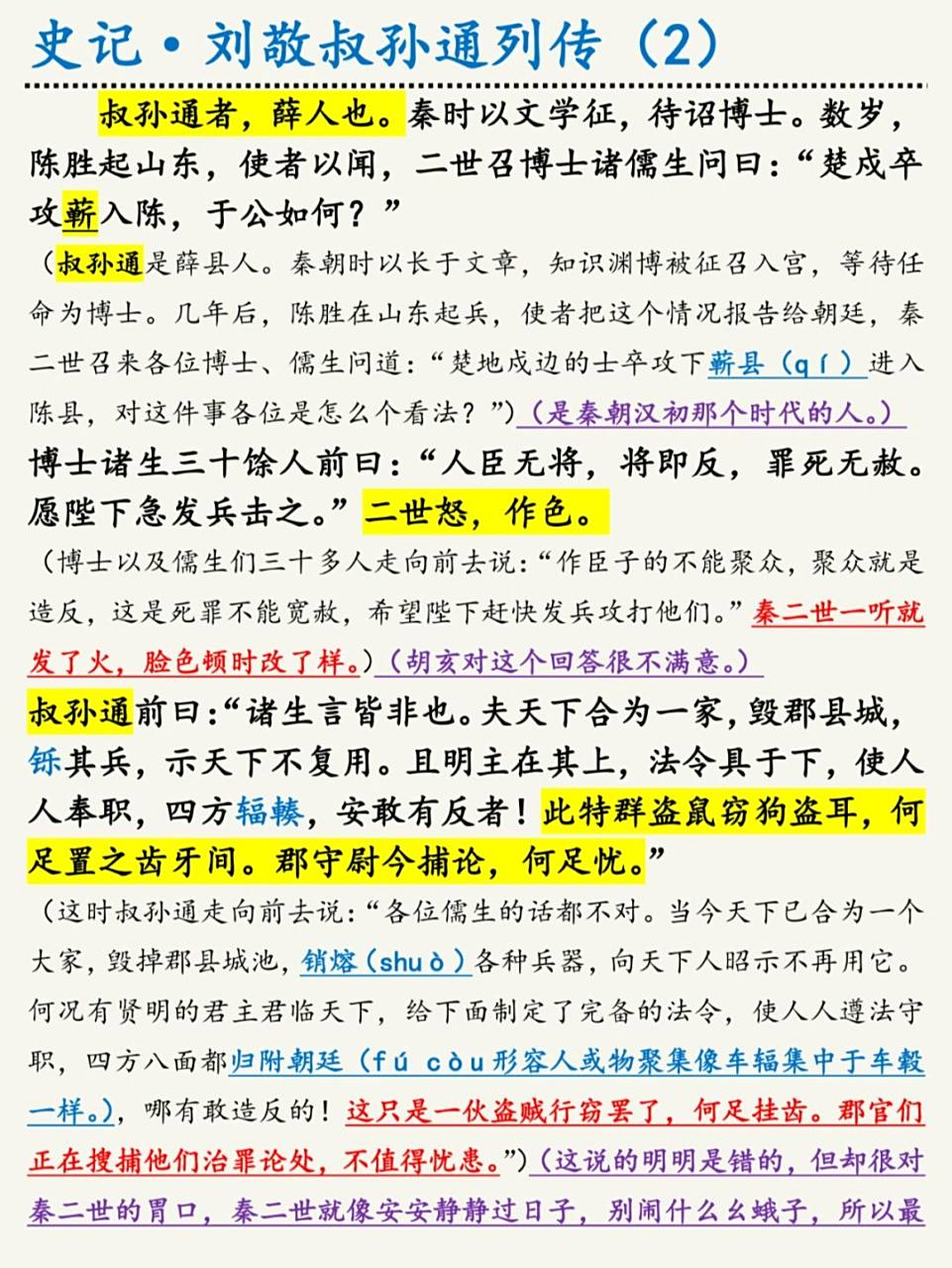
사실 사마광의 평가는 당시 현실을 고려하면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 전한 초반기에는 워낙 규례에 대해 까막눈인 사람이 많았고, 벼락 출세한 사람들이 고위층에 포진해 있어서 통상적인 예법으로는 질서 유지가 불가능했다. 분서갱유와 항우의 파괴로 옛 법에 대한 기록도 많이 사라진 상황에서, 황제조차 자신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였다.
비슷한 예로 주나라 초기 강태공과 주공 단의 아들 백금을 들 수 있다. 강태공은 제나라에 가서 현지 사정에 맞게 예법을 만들어 5개월 만에 일을 끝냈지만, 백금은 주나라 예법을 그대로 노나라에 전파하려다 3년이나 걸렸다. 결과적으로 제나라는 실리를 따지는 나라가 되었고 노나라는 예법이 잘 보존된 나라가 되었다. 숙손통의 선택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대적 재평가: 시대를 앞서간 실용주의자
오늘날 숙손통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재평가받고 있다. 그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택한 실용주의자였지만, 동시에 정말 중요한 원칙 앞에서는 목숨을 거는 신념의 사람이기도 했다.
그의 처세술은 단순한 기회주의와는 다르다. 생존을 위해 주군을 바꾸되, 한번 선택한 후로는 배신하지 않았다. 형식적인 예법은 시대에 맞게 바꾸되, 왕위 계승의 원칙 같은 근본은 목숨을 걸고 지켰다. 이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형식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지혜였다.
오대십국시대의 재상 풍도와 닮았다는 평가도 있다. 둘 다 유학자지만 현실주의자였고, 필요하면 주군을 바꿀 수 있었지만 정말 원칙을 지켜야 할 때는 목숨을 걸었다. 전근대에는 호불호가 갈렸지만 21세기에는 긍정적인 평을 듣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숙손통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간 한 지식인의 생존 전략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의 삶은 때로는 비굴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시대를 정확히 읽고 본질과 형식을 구분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건강 > 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돌고 도는 생명의 수레바퀴: 맷돌에 담긴 문화상징적 의미들 (1) | 2025.08.31 |
|---|---|
|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1884-1962)의 4원소론 (10) | 2025.08.19 |
| 노드롭 프라이(Northrop Frye) 신화문학론 (5) | 2025.08.19 |
